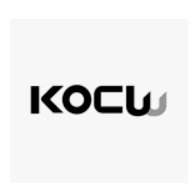아직 그 곳에는 ‘이어도’가 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아직 그 곳에는 ‘이어도’가 있다
3부 잠녀를 만나다-정태숙 할머니
물질 솜씨 좋아 '아기상군'으로 불리기도
생활고 바다작업 고단함 '소리'로 풀어
"바다 옆 지키다 올라오는 생복이나 잡을까"
날이 좋으면 멀리 수평선 넘어 이어도가 보인다는 안덕면 대평리 잠녀들은 올 들어 설 전까지 바다에 들지 못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작업에 참가했던 노 잠녀가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작업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찍 찾아온 봄기운에 잔뜩 흥이 난 바다 색은 곱기만 하다. 그 안에서 보물 하나를 찾았다.
▲ 물질 준비를 마친 잠녀들 [사진으로 본 제주 역사]발췌
#바깥 물질 통해 ‘소리’배워
지붕 없는 마을 미술관’이란 부연 설명이 아니어도 대평리는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지난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 등이 전국적으로 추진한 ‘길섶미술로 꾸미기’사업의 일환으로 ‘올레길-ART올래’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마을은 새 옷을 갈아입었다.
지명은 있지만 지번은 감산리로 등록되면서 ‘있지만 없는’마을에서 제주 올레 코스로 존재감을 찾았고 또 벽화조형물들로 볼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도 마을’이라 불리는 이 곳에서 정태순 할머니(89)를 만났다. 곳 물질을 주로 하는 터라 배를 타고 나가 작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대평리지만 정 할머니는 노 젓는 소리를 잘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취재진의 요청에 몇 번이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이내 기억을 더듬어 소리를 한다. 오연수 어촌계장(여·55)이 할머니의 소리를 거든다. “골목골목 연기는 나고/우리 님은 어디나 가고/날 초자 올 줄 몰라…” 생활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탓에 부르는 잠녀마다 가사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어도 사나’하는 후렴구에 토해내는 듯한 장단은 똑같다.
멀리 일본 쓰시마며, 평양, 장전까지 안 누빈 바다가 없다는 정 할머니의 소리는 바깥 물질을 나간 동안 저절로 배워진 것이라고 했다.
정 할머니는 “물질을 하려면 노를 저어가야 했고 소리라도 내지 않으면 힘든 걸 견디기 힘들었다”며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비가 와서 작업하지 못한 날 낯선 일본 쓰시마 섬 다다미 마루에 20여명이 나란히 누워 흥얼흥얼 불렀던 노래도 남아있다. 가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우리나라 말은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정 할머니는 어느새 66년전 그 날로 가 있다.
그 시절을 살던 제주 여성이라면 누구나 그랬듯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물질을 배웠고 또 바깥물질도 마다치 않았다. 17살부터 모집책이던 작은 아버지를 따라 쓰시마에서 작업을 했고 ‘아기 상군’소리를 들을 만큼 당찼다.
그랬던 정 할머니는 일찍 물질을 그만 뒀다. 49살 되던 해 남동생을 바다에 잃고 난 뒤 바다를 보는 일마저 힘이 들었다. 그동안의 힘들었던 일이며 위험했던 순간들이 한시도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아 아예 잠수증까지 반납해 버렸다.
#“더 배워 할 사람이 있을까”
물질하면 떠오른 것은 힘들고 배가 고팠던 기억뿐이다. 일제 침략기 공출을 피해 몰래 목화며 고소리술을 작업했던 일에서부터 쓰시마에서 줄미역 작업을 했던 일이며,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복껍데기와 호박을 바꿔먹었던 일이며, 생전복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 일본에서 부산까지 배를 타고 나왔던 일이며 옛날 기억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장전에는 여기 마라도처럼 작업하러 가는 길에 밥을 해 올리고 무사히 작업을 마치도록 도와달라고 치성을 들이는 앞섬이 있다는 얘기에 흥을 낸다.
정 할머니는 ‘배운 버릇’을 버리지 못해 마을 작업 때는 바다에 나갔다. 아니 나갔었다. 물질이 과거형이 된 것은 세월 탓이다. “이제는 바다에 들어가면 발이 떨려서…” 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옛 기억을 떠올리는 동안 정 할머니는 힘겹게 강원도까지 나가 물질 작업을 하고 난 뒤 유동치마를 사 입고 돌아오는 길 “참 곱기도 하다”는 어른들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던 23살로 돌아갔다. 구감이니 생감이니 순을 자르고 난 고구마를 흙에 묻어두었다가 먹었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도 어제만 같다. ‘이어싸나’ 소리만 나도 손에 힘이 들어간다.
“뭐 이제는 작업할 잠녀들도 없고, 더 배워 할 사람이 있을까” 체념 섞인 소리를 하던 정 할머니는 “길에 나와 앉았다가 전복이 올라오면 잡을까 싶다”고 농을 던진다. 취재가 한창인 방안이 일순 불턱이 됐다.
농을 받아 웃어 볼까도 했지만 생각과 달리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바다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지만 잠녀들의 흔적은 자꾸 어제가 되는 것 같아 돌아오는 발길이 무거워졌다.
▲ 날이 좋으면 멀리 이어도가 보인다는 안덕면 대평리 바다
2010/3/2-제민일보-고 미 기자
- 이전글“日도 천안함 문제 한국 전면지지” 10.05.19
- 다음글영해 밖 해양과학기지 주변 관할권 강화 10.05.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